
흑인 보스와
백인 운전사 조합이
이상하던 시절,
인종을 넘은 우정 이야기
영화 <그린 북>
● 글. 정민아 영화평론가, 성결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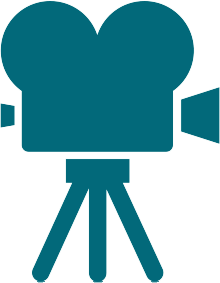
이 영화는 1962년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버디 로드무비다. 동행하는 사람은 흑인과 백인. 그런데 흑과 백 두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흑인 운전사와 백인 보스? 아니, 백인 운전사와 흑인 보스다. 1962년에 말이다. 올해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 작 품상과 각본상, 남우조연상을 받은 작품성 있는 수작인 데다, 코미디라는 장르 안에서 당시의 부조리함과 비인간성을 마음껏 비웃어주 니 카타르시스가 한껏 솟아오른다.

운명적으로 만난 흑과 백 두 남자의 실화
1960년대 초 미국은 이른바 역사상 가장 진보적이고 젊다고 칭해지던 J.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시절이니, 인종이니 성별이니 하는 문제가 획기적으로 나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럴 리 만무했다. 그때에도 흑백분리 정책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었다. 버스에서 흑인은 뒷자리에 앉아야 했고, 식당에서는 출입구나 화장실 옆에 앉았다. 백인 전용 식당에 들어간 흑인 청년 네 명으로 인해 촉발된 일명 ‘싯인(sit-in)’ 운동이 1960년에 처음 일어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리더로 한 흑인민권운동이 1963년이 되어서야 조직적으로 미국 전역에 일어났으니, <그린 북>의 배경은 두 역사적인 사건 사이에 놓인다.
운명적으로 두 남자가 만난다. 뉴욕 브롱스로 대가족과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자인 한 사나이는 나이트클럽에서 거친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한다. 또 다른 남자는 맨해튼 한복판, 부자들이 다니는 카네기홀 바로 위층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는 고독한 피아니스트로 품위와 우아함이 몸에 배어 있다. 거친 악센트가 무학임을 드러내는 백인과 정확한 상류층 영어로 발음하는 유식해 보이는 흑인. 당시로서는 꽤나 이상한 조합이다. 가족, 교육, 부, 취미, 생활 등이 상반된, 전혀 만날 일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만난다.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다 일시 휴직을 하게 된 토니는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일할 곳이 필요하던 중 유명 피아니스트인 돈 셜리 박사의 운전사 자리를 얻는다. 미국 전역으로 연주 여행을 떠나게 된 셜리는 흑인인 자신을 보호해줄 거칠고 든든한 백인 운전기사가 필요했다.
이 간단한 줄거리에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던 <드라이 빙 미스 데이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흑인 운전수와 백인 노인 여성의 로드를 그린 휴먼 코미디 영화로, 인종 문제를 유연하고 훈훈하게 다루었다. 그런데 <그린 북>은 그와 같은 설정을 뒤집는다. 백인 운전자와 흑인 고용주. 그와 같은 일이 1960년대 초에 가능했을까?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사실. 영화는 실화를 기초로 한다. 운전수인 토니의 아들 닉 발레롱가가 아버지의 특별했던 여행과 더욱 특별했던 우정을 기리기 위해 시나리오를 썼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각색한 이 영화로 오스카 각본상 트로피 를 거머쥐었다.
약점 많은 문제투성이 인간들의 연대
제목인 ‘그린 북’은 흑인 여행자를 위한 안내 책자로 숙소와 레스토랑 정보를 담고 있다. 지금은 없어진 유물이지만 그 시대 흑인 여행자에게 그린 북은 여행 필수 아이템으로, 영화에서는 흑과 백을 분리했던 당시를 상기하는 중요한 소품이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가 삐걱거린다. 토니는 흑인 고용주의 명령을 마뜩잖아 하고, 셜리는 거칠고 제멋대로인 토니가 거슬린다. 그러나 두 사람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남부로 향할수록 셜리를 ‘재주 좋은 흑인 노예’ 혹은 ‘품위 있는 백인 문화를 돋보이게 해줄 장식품’ 정도로 취급하는 백인 커뮤니티의 뻔뻔함이다. 음악가로서 무대에서 연주할 수는 있지만, 대기실은 창고를 써야 하고, 밥은 함께 먹을 수 없고, 화장실은 바깥것을 이용해야 한다. 생활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지만, 백인들의 너그러움과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서 흑인이 필요하다는이 역설은 분노로 들끓게 한다. 하지만, 셜리는 매번 경험했을 일. 침착한 셜리 대신 토니가 화를 낼 때, 그들은 진정 친구가 되어간다. 사랑하는 자는 분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부를 거쳤다가 북부로 돌아오는 길에 토니는 ‘당신네 사람의 음악’인 로큰롤을 셜리에게 들려주고, 셜리는 토니가 아내에게 쓰는 편지에 문학적인 은유로 소통의 멋을 일깨워준다.
처음에는 냉랭하던 두 사람은 이내 서로 돕고 함께 사는 것을 여행 과정에서 깨닫는다.
영화는 갈등을 전면에 내세우고서 교훈을 섣불리 주입하려들지 않는다. 많은 갈등이 드러나지만, 이 갈등이 두 사람의 개과천선으로 봉합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흘러간다.
두 사람 모두 약점과 문제점을 가진 인간이다. 이들은 다른 형태의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다. 토니가 노골적인 차별주의자라면, 셜리 또한 자신이 속한 인종을 부끄러워하는, 내면이 하얀 사람이다. 도덕적이지 않지만 가족만큼은 살뜰하게 보살피는 토니, 지적이고 도덕적으로 우월하지만 스스로 고립의 길을 쌓은 셜리. 그렇게 문제적 인간 두 사람이 만나 남부라는 거대한 갈등의 용광로에 깊이 들어갔다 다시 돌아온 뉴욕 집에서는 어떤 결말이 기다릴까.
영화를 보고 나면 편지 한 장 쓰고 싶어지는 사랑스러운 작품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영화를 인종 문제라는 협소한 틀에 가둘 필요는 없다. 피부색, 부의 정도, 교육 수준, 가치관, 취미, 습관,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겉모습을 거두고 속을 들여다보니 다 똑같은 인간이었다. 인종 차별의 문제를 넘어,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며 평생을 나누는 친구들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로 이 영화는 충분히 훌륭하다.

흑인 보스와
백인 운전사 조합이
이상하던 시절,
인종을 넘은 우정 이야기
영화 <그린 북>
● 글. 정민아 영화평론가, 성결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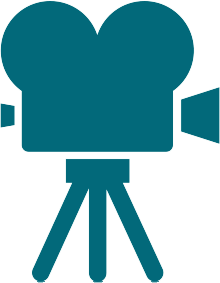
이 영화는 1962년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버디 로드무비다. 동행하는 사람은 흑인과 백인. 그런데 흑과 백 두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흑인 운전사와 백인 보스? 아니, 백인 운전사와 흑인 보스다. 1962년에 말이다. 올해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 작 품상과 각본상, 남우조연상을 받은 작품성 있는 수작인 데다, 코미디라는 장르 안에서 당시의 부조리함과 비인간성을 마음껏 비웃어주 니 카타르시스가 한껏 솟아오른다.

운명적으로 만난 흑과 백 두 남자의 실화
1960년대 초 미국은 이른바 역사상 가장 진보적이고 젊다고 칭해지던 J.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시절이니, 인종이니 성별이니 하는 문제가 획기적으로 나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럴 리 만무했다. 그때에도 흑백분리 정책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었다. 버스에서 흑인은 뒷자리에 앉아야 했고, 식당에서는 출입구나 화장실 옆에 앉았다. 백인 전용 식당에 들어간 흑인 청년 네 명으로 인해 촉발된 일명 ‘싯인(sit-in)’ 운동이 1960년에 처음 일어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리더로 한 흑인민권운동이 1963년이 되어서야 조직적으로 미국 전역에 일어났으니, <그린 북>의 배경은 두 역사적인 사건 사이에 놓인다.
운명적으로 두 남자가 만난다. 뉴욕 브롱스로 대가족과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자인 한 사나이는 나이트클럽에서 거친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한다. 또 다른 남자는 맨해튼 한복판, 부자들이 다니는 카네기홀 바로 위층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는 고독한 피아니스트로 품위와 우아함이 몸에 배어 있다. 거친 악센트가 무학임을 드러내는 백인과 정확한 상류층 영어로 발음하는 유식해 보이는 흑인. 당시로서는 꽤나 이상한 조합이다. 가족, 교육, 부, 취미, 생활 등이 상반된, 전혀 만날 일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만난다.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다 일시 휴직을 하게 된 토니는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일할 곳이 필요하던 중 유명 피아니스트인 돈 셜리 박사의 운전사 자리를 얻는다. 미국 전역으로 연주 여행을 떠나게 된 셜리는 흑인인 자신을 보호해줄 거칠고 든든한 백인 운전기사가 필요했다.
이 간단한 줄거리에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던 <드라이 빙 미스 데이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흑인 운전수와 백인 노인 여성의 로드를 그린 휴먼 코미디 영화로, 인종 문제를 유연하고 훈훈하게 다루었다. 그런데 <그린 북>은 그와 같은 설정을 뒤집는다. 백인 운전자와 흑인 고용주. 그와 같은 일이 1960년대 초에 가능했을까?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사실. 영화는 실화를 기초로 한다. 운전수인 토니의 아들 닉 발레롱가가 아버지의 특별했던 여행과 더욱 특별했던 우정을 기리기 위해 시나리오를 썼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각색한 이 영화로 오스카 각본상 트로피 를 거머쥐었다.
약점 많은 문제투성이 인간들의 연대
제목인 ‘그린 북’은 흑인 여행자를 위한 안내 책자로 숙소와 레스토랑 정보를 담고 있다. 지금은 없어진 유물이지만 그 시대 흑인 여행자에게 그린 북은 여행 필수 아이템으로, 영화에서는 흑과 백을 분리했던 당시를 상기하는 중요한 소품이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가 삐걱거린다. 토니는 흑인 고용주의 명령을 마뜩잖아 하고, 셜리는 거칠고 제멋대로인 토니가 거슬린다. 그러나 두 사람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남부로 향할수록 셜리를 ‘재주 좋은 흑인 노예’ 혹은 ‘품위 있는 백인 문화를 돋보이게 해줄 장식품’ 정도로 취급하는 백인 커뮤니티의 뻔뻔함이다. 음악가로서 무대에서 연주할 수는 있지만, 대기실은 창고를 써야 하고, 밥은 함께 먹을 수 없고, 화장실은 바깥것을 이용해야 한다. 생활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지만, 백인들의 너그러움과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서 흑인이 필요하다는이 역설은 분노로 들끓게 한다. 하지만, 셜리는 매번 경험했을 일. 침착한 셜리 대신 토니가 화를 낼 때, 그들은 진정 친구가 되어간다. 사랑하는 자는 분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부를 거쳤다가 북부로 돌아오는 길에 토니는 ‘당신네 사람의 음악’인 로큰롤을 셜리에게 들려주고, 셜리는 토니가 아내에게 쓰는 편지에 문학적인 은유로 소통의 멋을 일깨워준다.
처음에는 냉랭하던 두 사람은 이내 서로 돕고 함께 사는 것을 여행 과정에서 깨닫는다.
영화는 갈등을 전면에 내세우고서 교훈을 섣불리 주입하려들지 않는다. 많은 갈등이 드러나지만, 이 갈등이 두 사람의 개과천선으로 봉합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흘러간다.
두 사람 모두 약점과 문제점을 가진 인간이다. 이들은 다른 형태의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다. 토니가 노골적인 차별주의자라면, 셜리 또한 자신이 속한 인종을 부끄러워하는, 내면이 하얀 사람이다. 도덕적이지 않지만 가족만큼은 살뜰하게 보살피는 토니, 지적이고 도덕적으로 우월하지만 스스로 고립의 길을 쌓은 셜리. 그렇게 문제적 인간 두 사람이 만나 남부라는 거대한 갈등의 용광로에 깊이 들어갔다 다시 돌아온 뉴욕 집에서는 어떤 결말이 기다릴까.
영화를 보고 나면 편지 한 장 쓰고 싶어지는 사랑스러운 작품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영화를 인종 문제라는 협소한 틀에 가둘 필요는 없다. 피부색, 부의 정도, 교육 수준, 가치관, 취미, 습관,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겉모습을 거두고 속을 들여다보니 다 똑같은 인간이었다. 인종 차별의 문제를 넘어,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며 평생을 나누는 친구들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로 이 영화는 충분히 훌륭하다.